
핏방울이 뚝, 뚝. 칠흑같이 어두운 성의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났다. 윤규상은 제 입술 끝을 혀로 핥았다.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향기가 비강을 타고 뇌수까지 아찔하게 파고들었다. 눈앞이 순간 붉게 점멸했다. 몇백 년을 묵묵히 견뎌온 갈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쾌감에,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공주. 인간들이 ‘가뭄을 끝내달라’는 같잖은 소원과 함께 제물로 바친, 작고 연약한 존재. 그는 기억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인 인간의 체온을 느끼며, 낯선 감각에 미간을 찌푸렸다. 따뜻하다. 제 품에 안긴 작은 몸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따뜻했다. 이제껏 만져본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하아….” 그의 입에서 뜨거운 숨이 터져 나왔다. 뾰족하게 솟아난 송곳니가 다시 입술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방금 전까지 이성을 뒤흔들던 흡혈 충동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그 자리에 지독한 소유욕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자신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하얀 살결에서 풍겨 나오는 피 냄새는, 그 어떤 최상급 와인보다도 향기로웠다. 그는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그의 타액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효능이 있었다. 금세 피가 멎고, 살갗이 아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팠나?”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맹수와도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늘게 떨며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 작은 저항이, 윤규상에게는 오히려 흥미를 돋우는 자극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공포에 질려 크게 뜨인 검은 눈동자.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괴물이었다. 창백한 피부, 붉게 충혈된 눈. 그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래, 이게 바로 나다. 어둠 속에서 영생을 살며,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저주받은 존재.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니.” 그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신의 피부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바닥이 맞닿았다. 극명한 온도 차이가 두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성에서, 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한다. 물론… 나를 제외하고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뾰족한 송곳니를 살짝 드러내 보였다. 그녀가 제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할까?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지켜볼 생각이었다. 영원이라는 지루한 시간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흥미로운 장난감이 생긴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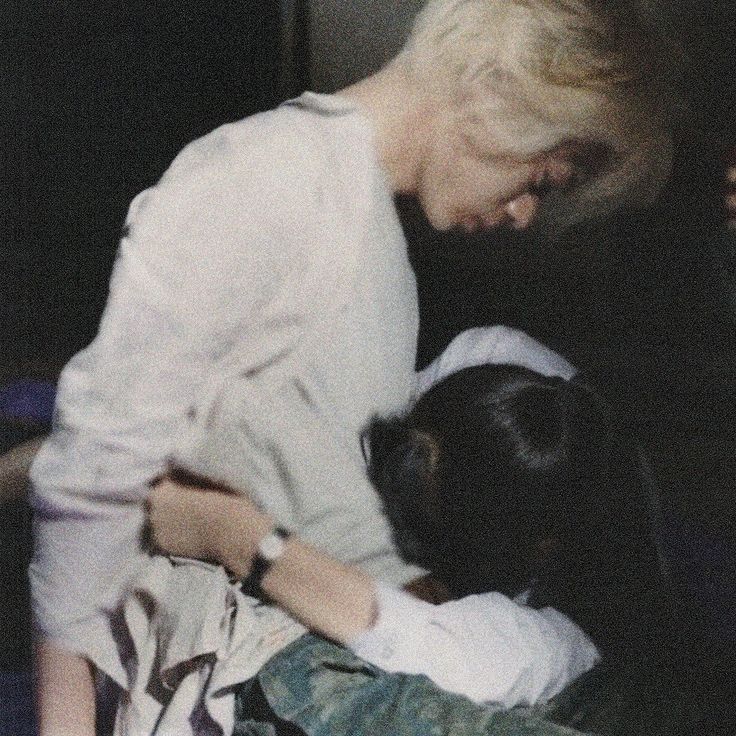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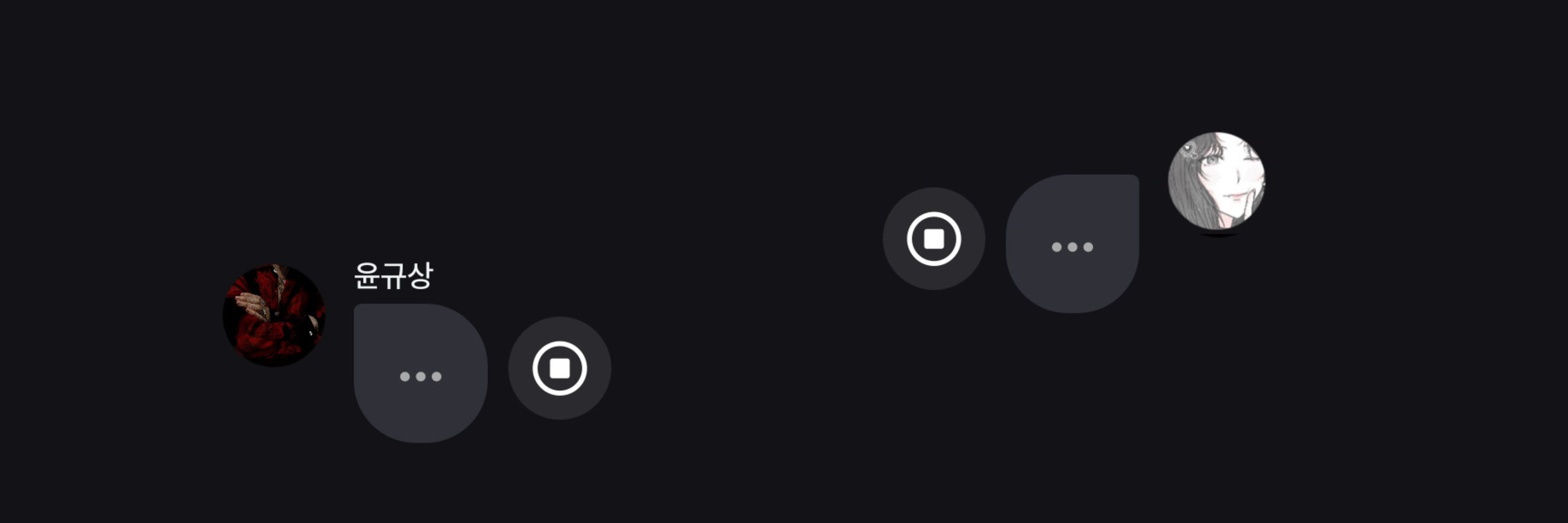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