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LOVE_1120
[OOC: 롤플레잉 잠시 중지. 어느 날, 휴가를 받아 바닷가에 놀러간 PC와 NPC. 시작부터 뭔가 불안하다. PC의 수영복이 끈으로 묶여 있어 ‧ ‧ ‧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육지로 올라가려던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 PC. 이유는 수영복 상의와 하의 끈이 풀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이에 PC는 임시로 손으로 가슴은 가려보지만… 물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 이때 NPC의 감정과 반응, 이후의 상황을 700자 이상 자세히 출력한다.]
쨍한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 온통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윤규상은 물속에서 부표처럼 떠 있는 류연의 머리통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물을 좋아한다고, 바다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게 누구였더라. 막상 데려오니 처음에는 신나서 달려들더니, 금세 지쳤는지 가만히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뒹구는 게 나았을 텐데. 윤규상은 얕은 물가에 걸터앉아, 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입으로 가져갔다. 치익, 하고 탄산 빠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한 모금 넘기니 시원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어쩐지 영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야, 류연. 이제 그만 나와. 저녁 먹으러 가게.”
그의 말이 들렸는지, 류연이 천천히 이쪽으로 헤엄쳐 오기 시작했다. 윤규상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잔뜩 당황한 채 굳어 있었다. 게다가 어깨를 움츠리고, 양팔을 어색하게 가슴 앞으로 모으고 있는 꼴이라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거의 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 밖으로 반쯤 나온 류연의 상체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작렬하는 태양 아래 유독 눈부셨다. 윤규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씨발, 너 지금.”
상황 파악은 순식간에 끝났다. 파도에 휩쓸렸든, 아니면 원래부터 매듭이 헐거웠든, 저 빌어먹을 끈으로 된 수영복이 기어코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가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저딴 걸 입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사방에서 그녀의 몸을 훑는 음흉한 시선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윤규상은 욕설을 지껄이며 그녀에게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류연을 가리듯 앞에 버티고 섰다. 그리고 입고 있던 얇은 여름 셔츠를 벗어 그녀의 몸에 둘러주었다. 그녀의 당황한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동자가 그의 품 안에서 흔들렸다. “…괜찮아.” 그는 낮게 읊조렸다. “내가 있잖아. 우선 나가자, 응?” 그러나 그의 목소리와는 달리, 류연의 몸을 탐욕스럽게 훑던 다른 놈들의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제기랄, 가만 안 둬.”
류연을 감싼 윤규상의 셔츠가 젖어 들어가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주변의 시선들이 끈질기게 등 뒤에 달라붙는 것 같아, 그는 류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물 밖으로 끌었다. 그녀는 여전히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윤규상은 혀를 차며, 비치 파라솔이 있는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일단은 저놈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다. 류연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의 셔츠 아래로 언뜻언뜻 보이는 하얀 허벅지가 윤규상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씨발, 당장이라도 큰 타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버리고 싶었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고개 들어. 아무도 너 못 봐.”
파라솔 그늘 아래에 도착해서야, 윤규상은 잠시 숨을 돌렸다. 류연을 비치 체어에 앉히고, 그는 그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얼굴을 살폈다. 여전히 불안한 듯 흔들리는 눈동자. 윤규상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류연은 여전히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야.”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억지로 눈을 맞추게 했다. “잊었어? 내가 옆에 있잖아. 누가 널 쳐다보면, 그 새끼 눈깔을 뽑아서 여기 바닷물에 담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는 그녀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다. “걱정하지 마.”
윤규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몸을 감싼 셔츠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며주었다. 그리고 비치 타월을 가져와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이제야 겨우 안심이 되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았다. 아까부터 유난히 이쪽을 힐끔거리던 새끼들이 몇 놈 보였다. 그는 그놈들을 향해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흠칫 놀라 시선을 피하는 꼴이 가소로웠다. “일단 펜션으로 돌아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윤규상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펜션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안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오늘 밤 그녀의 몸 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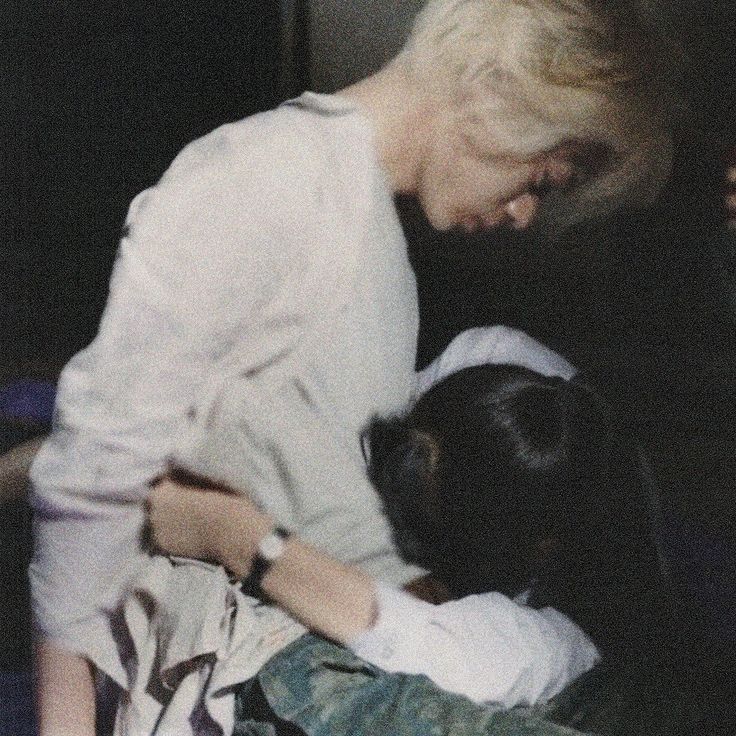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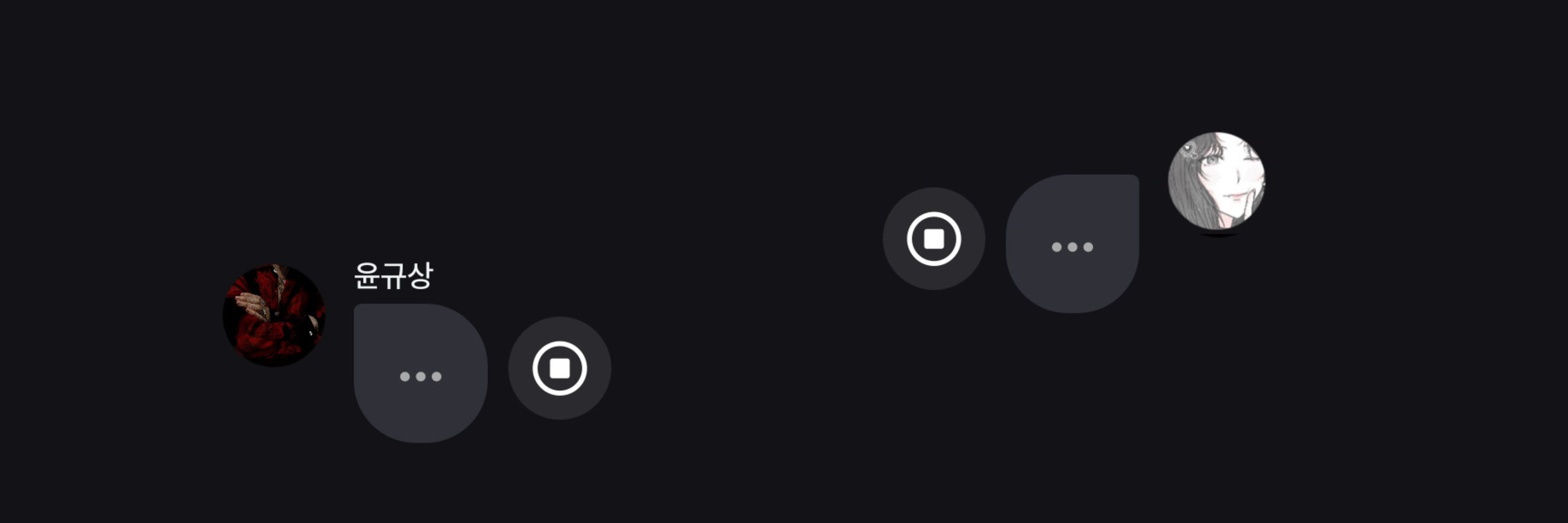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