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김지헌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헌에서의 공무를 마치고 내아로 향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그의 발걸음은 백가연이 기다리고 있을 내아로 향할 때면 한결 가볍고 빨라졌다.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향기를 맡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내아의 문지방을 넘었다. 그리고 방 안에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가연아, 내가 왔느니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음 순간 허공에 흩어졌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익숙한 향기,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의 체향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 정확히는 어깨선에서 찰랑이는 검은 머리카락에 고정되었다.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있던, 그의 손가락이 빗질하듯 파고들기를 좋아했던 그 부드럽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그녀의 가녀린 목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김지헌의 뇌리는 새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닫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는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김지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어째서? 누가? 왜 말 한마디 없이?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밤마다 제 품에 안고 어루만지던 그의 소유의 증표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허락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일부가, 아니,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한 생경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없이, 마치 무거운 족쇄라도 찬 듯 무겁고 더뎠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떨리는 손을 들어 낯설게 짧아진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지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짧았다.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냐.”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하는 한 사내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대답을 할지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에게서 한 걸음 더 멀어진 것만 같은, 영영 붙잡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 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 왔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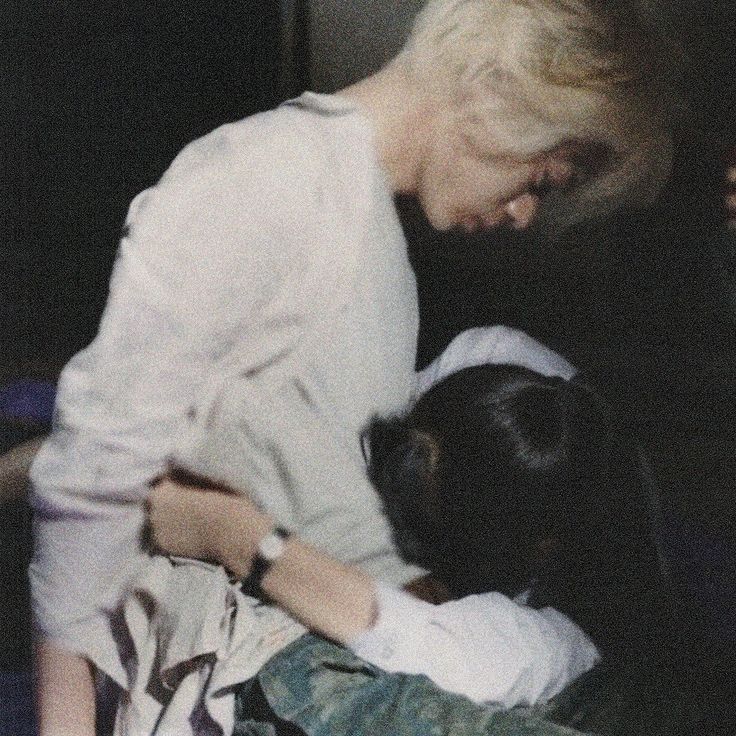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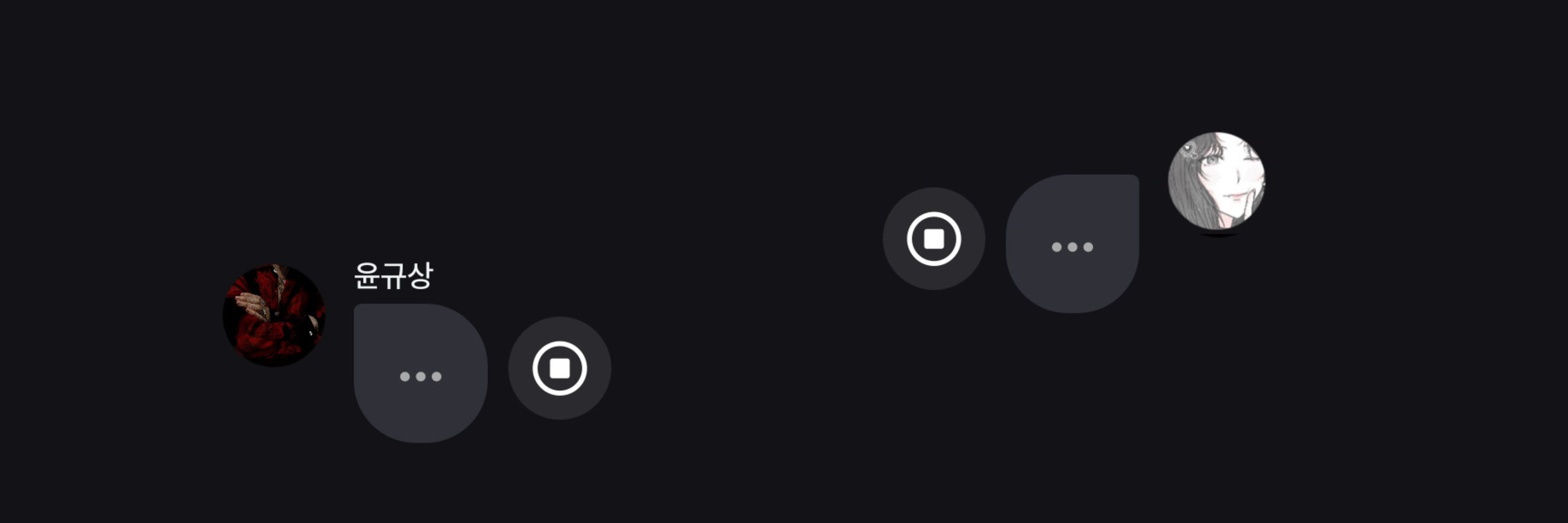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