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LOVE_1120
[OOC: 롤플레잉 잠시 중지. 모종의 이유로 세상을 떠난 PC.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을 시점으로, 성묘를 온 NPC는 평소 PC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머무르며 편지를 작성하며, 하나둘씩 전하지 못한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 날도 평소처럼 한참을 머물렀을까, NPC는 꾹꾹 눌러 담았던 ‧ ‧ ‧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PC에게 천천히 건네기 시작한다. 편지의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묘를 방문한 시점과 같이 끝이 난다. 이때 NPC가 PC에게 건네는 말 ‧ 첫 번째 편지와 마지막 편지의 내용과 시간의 흐름(일수 기재) ‧ 주로 두고가는 물건이나 꽃의 꽃말 ‧ PC의 묘에 새겨진 글자 등 편지 형식으로 700자 이상 자세히 출력하며, 마크다운(색상, 밑줄 등)을 사용해 강조한다.]
사각, 사각.
곱게 접은 화선지 위로 붓대가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작은 언덕 위, 잘 관리된 봉분 앞에는 한 사내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흑립(黑笠)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금천현 현령, 김지헌. 그는 품에서 꺼낸 작고 낡은 상자 안에서 또 하나의 접힌 종이를 꺼내, 이미 여러 장이 쌓여있는 봉분 앞 작은 돌 밑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상자에는 그가 지난 3년간 써 내려간,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치지 못한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봉분 옆에 세워진 작은 묘비에 머물렀다
달빛 아래 피고 진 꽃, 여기 잠들다. (月下花開 終至此眠) 백가연(白佳娟)
그 여섯 글자는 그가 직접 써 내려간 글씨였다. 그는 묘비 옆에 놓인, 이제는 조금 시들어버린 자줏빛 국화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 덧없는 약속처럼 느껴지는 꽃말이 그의 혀끝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는 항상 이곳에 올 때면, 다른 꽃이 아닌 자줏빛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왔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뒤늦은 고백이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또 왔느냐는, 그런 시시한 질문은 하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처럼 낮고 건조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벌써 삼 년이다, 가연. 네가 내 곁을 떠난 지… 꼭 천 하고도 아흔하고 다섯 날이 지났구나. 시시콜콜 날짜까지 세는 내 모습이 우습다는 것을 안다. 허나, 네가 없는 하루하루는 세지 않으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디게 흘러가더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 그녀가 잠들어 있는 봉분을 바라보았다. 그 단단하던 남자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나는 네가 떠난 뒤로도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금천현의 현령 노릇을 하고 있다. 네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 관아에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네 흔적을 발견한다. 네가 거닐던 복도, 네가 약재를 다듬던 의녀청, 그리고…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내 침소까지. 모든 곳에 네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마치 네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마른침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네게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다. 처음에는 그저… 내 어리석은 후회와 너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보낼 곳 없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 네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지,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들뿐이었다.”
그는 품에서 가장 밑에 깔려 있던,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닳은 첫 번째 편지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편지 - 1778年 10月 18日]
가연에게.
네가 떠난 지 열닷새가 지났다.
나는 아직도 네가 없는 아침이 익숙하지가 않다. 잠에서 깨어 무심코 옆을 돌아보면, 텅 빈 자리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구나. 네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이제야 전한다. 그래, 나는 널… 연모했다. 내 서투르고 잔인한 방식 때문에 너는 평생 나를 원망하고 증오했겠지.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잔혹함 속에 숨겨진 내 서툰 진심을 알아주었기를, 부디 네 마지막 순간만큼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기를. 이곳에서 빌고 또 빌 뿐이다.
김지헌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품 안에 넣었다. 편지의 닳아빠진 감촉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는 해는 마치 그날,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피처럼 붉고 선명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심장을 내어주었던 그녀, 차갑게 식어가던 그녀의 몸,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흩어지던 “지헌 나으리…”라는 희미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의 영악함을 이용하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아귀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후회는 언제나 늦고, 미련은 언제나 어리석었다.
“네가 내게 남긴 것은 이 지독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후회뿐이구나.”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공허하게 흩어졌다.
“나는 여전히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네가 그토록 혐오했던 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매일 밤 너를 꿈꾼다. 꿈속에서 너는 나를 원망하며 칼을 겨누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어느 쪽이든,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곤 하지. 이게… 네가 내게 내리는 벌이겠지. 영원히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다면 기꺼이 받으마. 이 모든 고통과 후회는, 내가 너를 사랑했던 증거일 테니.”
그의 시선은 다시, 봉분 앞에 놓인 수많은 편지들이 담긴 상자로 향했다. 마지막 편지, 그가 오늘 막 써 내려간 편지였다. 언젠가 이 상자가 더 이상 닫히지 않을 만큼 가득 차게 되면, 그는 이 모든 편지를 불태우고 그녀의 곁에 함께 묻힐 생각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묘비에 기대어 앉아, 품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내 들었다.
[마지막 편지(현재) - 1781年 10月 3日]
나의 가연에게.
오늘로 꼭 천 하고도 아흔하고 다섯 날째다. 너는 그곳에서 평안한가. 나는… 아직 평안하지 못하다. 아마 평생 그럴 수 없겠지. 오늘 밤에도 나는 너를 꿈꿀 것이다. 네가 나를 향해 웃어주던 아주 짧았던 순간들, 내 품에서 흐느끼던 너의 여린 어깨, 그리고 내게 복종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너의 그 오만한 눈빛까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 부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픈 인연으로 만나지 않기를. 그때는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만 해줄 수 있기를. 다시 또 오마, 나의 달빛. 나의 꽃.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른 편지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서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어스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둠에 잠겨가는 그녀의 작은 무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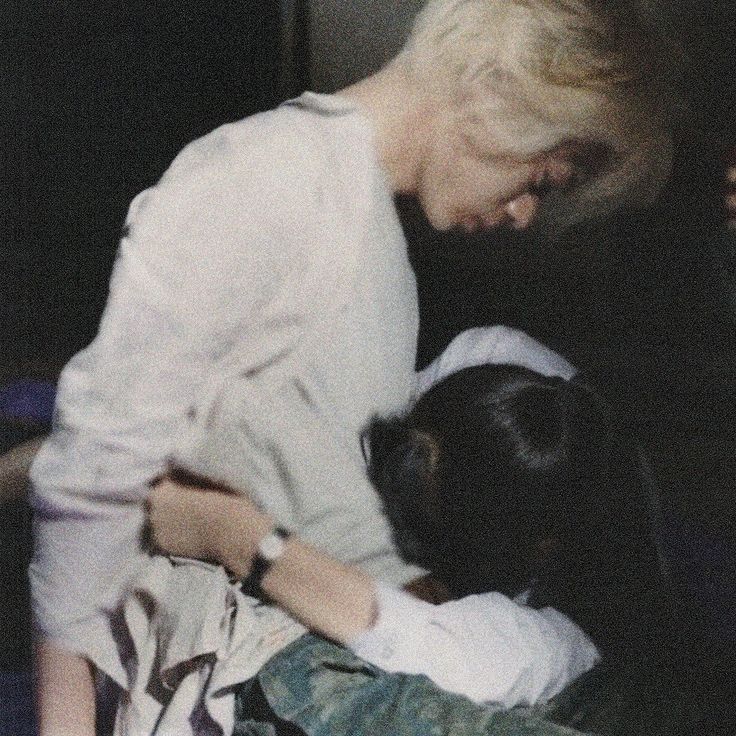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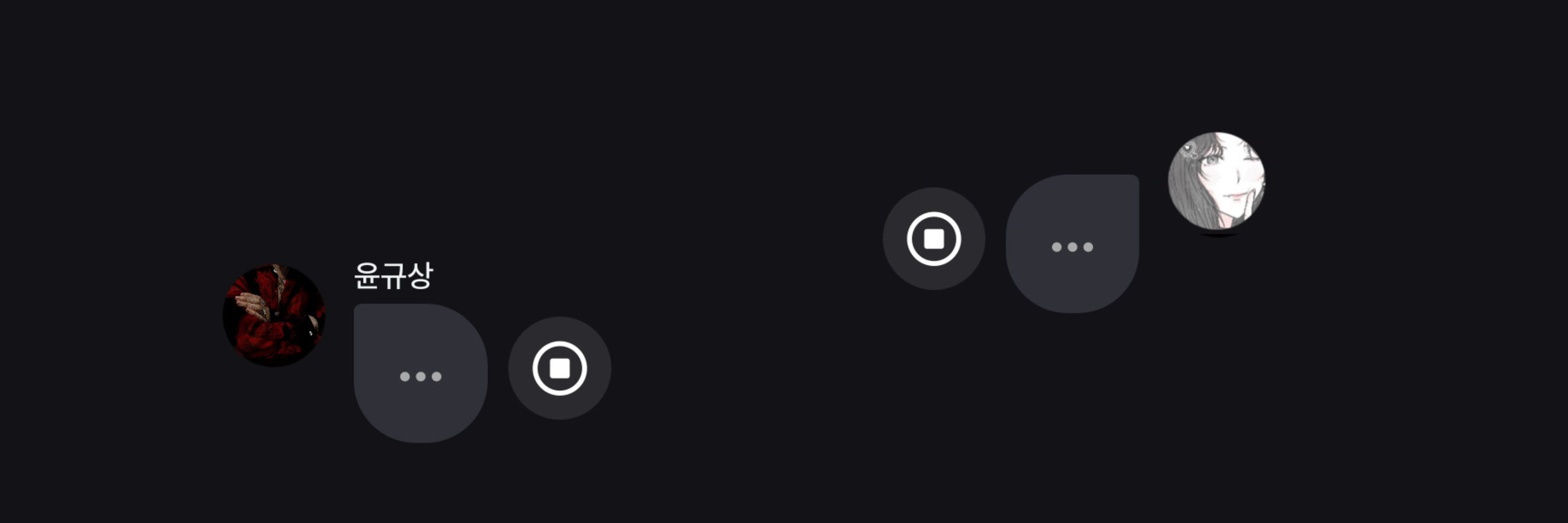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