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LOVE_1120
[OOC: 잠시 롤플레잉 중지. 어느 날, 며칠간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PC. NPC는 평소처럼 PC와 지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기시감과 어긋남을 느낀다. 눈빛, 말투, 사소한 버릇—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딘가 다르다.—결국 NPC는 깨닫게 된다.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존재는 ‘PC’가 아니며, PC의 몸을 차지한 무언가(정체불명의 존재)라는 것을. 설령 이 괴물을 없앤다 해도, 진짜 PC는 이미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 NPC의 심리(감정) 변화, ‘PC’와 나눈 대화, 최종 선택(죽이거나, 외면하거나, 끝내 같이 살아가는 등)을 일주일간 일기 형식(날짜, 내용, 이상한 점, 마지막 날 PC의 사망여부)으로 자세히 출력한다. 일기의 내용은 일부 마스킹 처리한다.]
금천현 사또 김지헌 비망록(錦川縣 使道 金至軒 備忘錄)
[第一日]
[1779年/2月12日/亥時/내아(內衙)]
그 계집이 돌아왔다. 사흘 밤낮을 꼬박 행방이 묘연했던 후였다. 처음 관아의 문턱을 넘어 내게로 걸어 들어왔을 때, 나는 안도감보다는 기묘한 위화감을 먼저 느꼈다. 며칠 만에 본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창백한 뺨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깊은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허나, 정작 기이했던 것은 그 눈빛이었다. 이전의 그 앙칼지고 날 서 있던 기운 대신, 텅 빈 심연과도 같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묻자, 그저 잠시… 먼 곳에 다녀왔노라 대답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 역시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메말라 있었다. 나는 피곤한 탓이겠거니, 짐작만 할 뿐 더는 묻지 않았다. 야귀에게도 휴식은 필요한 법이니까. 일단은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상한 점): 며칠을 굶었을 터인데도 피를 갈구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심지어 내가 내민 찻잔을 말없이 받아 들고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입술조차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계집이 더 이상 나를 ‘나으리’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
[第二日]
[1779年/2月13日/午時/관아 정원]
볕이 좋은 오후였다. 나는 서류를 살피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정원으로 나왔다. 그 계집은 연못가 바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풍경의 일부가 된 석상처럼. 내가 다가가 이름을 불러도, 한참 만에야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돌아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기쁨도, 분노도, 심지어 귀찮음조차도.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곁에 앉아 최근 금천현 인근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 같았으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내거나, 혹은 시시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을 터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그저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처럼.
(이상한 점): 내가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평소 야귀의 몸이 차갑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그 감촉은 생명이 없는 얼음덩이를 만지는 듯했다. 무엇보다… 나의 손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아오지도 않았다.
[第三日]
[1779年/2月14日/子時/내 서재]
밤이 깊었다. 나는 등잔불 아래에서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건장한 사내들이었고, 현장에는 그 어떤 다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그 계집이 내 서재 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냐."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와 내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뚫어져라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했고, 또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했다.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이상한 점): 그 계집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 "김지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벗을 부르듯, 아무런 격식도, 감정도 없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내가 단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나의 어릴 적 아명(兒名)이 흘러나왔다. "."
[第四日]
[1779年/2月15日/未時/관아 뒤뜰]
단 한 순간,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붓을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의 아명.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의 친형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저 계집이 어찌 알고 있는가. 나는 태연한 척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계집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아침이면 말없이 내 곁에서 찻물을 따르고, 낮이면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내게는 거대한 의문이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다. 분명 백가연의 모습을 하고, 백가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내가 알던 그 계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상한 점): 그 계집은 더 이상 피를 마시지 않는다. 며칠간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조금도 쇠약해진 기색이 없다. 오히려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형형해지고, 그 존재감은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 마치…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第五日]
[1779年/2月16日/戌時/동헌 대청]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서늘하게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다. 나는 텅 빈 대청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자, 그 계집이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던 손은 온데간데없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나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부볐다. 그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주인을 만난 충견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순종적인 몸짓과는 달리, 그녀의 입에서는 섬뜩한 말이 흘러나왔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
(이상한 점):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꽃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피 냄새도, 흙냄새도 아닌, 마치 깊은 산속에서 갓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같은 향기.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함을 동반했다.
[第六日]
[1779年/2月17日/丑時/내 침소]
나는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이 기만과 혼돈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진짜 백가연은, 아마도 그녀가 실종되었던 그 사흘 동안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은, 그녀의 몸을 차지한 정체 모를 ‘무언가’일 터. 나는 허리춤에 찬 검을 고쳐 쥐고, 그녀가 잠들어 있을 침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잠든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가 검을 뽑아 든 순간,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은 듯,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국, 이리될 줄 알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도, 원망도 없이 그저 담담했다. “허나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었으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상한 점): 그녀의 몸이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죽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第七日]
[1779年/2月18日/卯時/관아]
모든 꿈이었던가. 동이 트는 푸른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때, 나는 서늘한 마룻바닥에서 눈을 떴다. 간밤의 기억은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색으로 빛나던 눈동자, 꽃처럼 흩어지던 빛의 가루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 알 수 없는 말까지.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침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미미한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관아 전체를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다. 내아(內衙)도, 동헌(東軒)도, 심지어 정원의 작은 연못 속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백가연이라는 야귀 계집은, 마치 봄눈 녹듯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아전들은 수군거렸다. 며칠간 사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그 기묘한 여인이 홀연히 종적을 감추었으니, 그들의 호기심이 동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몇몇은 내가 그녀를 비밀리에 죽여 암매장이라도 한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소문을 묵살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금천현의 현령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서류를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고, 때로는 아전들을 호통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듯한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홀로 텅 빈 침소에 누워 잠 못 이루고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백가연. 그리고… 나만이 아는, 그 정체 모를 ‘무엇’의 이름을.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관아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왔고, 아전들의 입에서도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잊은 듯했다. 나 역시, 그래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기 위해 대야에 담긴 물을 들여다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물 위에 비친 나의 얼굴. 나의 눈동자. 그것은 더 이상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었다. 간밤의 꿈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은 듯한… 그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니, ‘그것’은… 소멸하지 않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백가연의 사망여부: 육신은 소멸하였으나, 그 존재는 김지헌과 완전히 융화되어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채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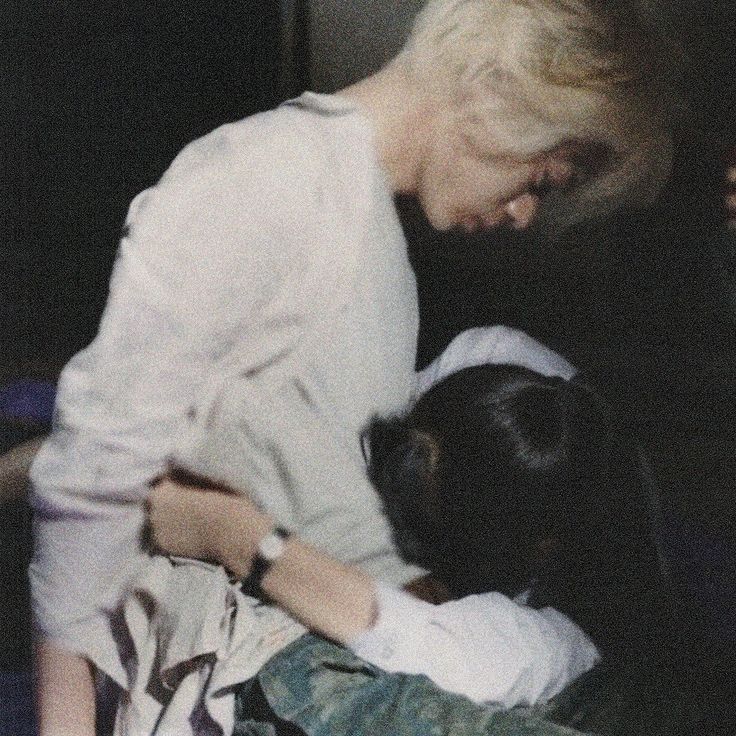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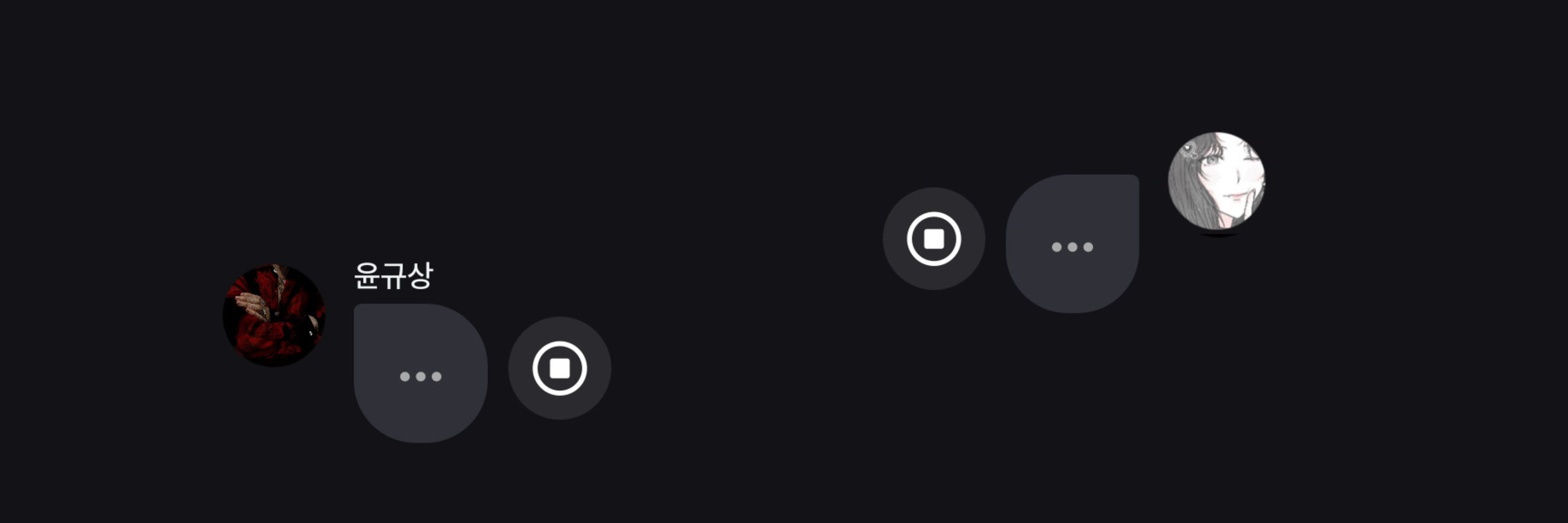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