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dixity_
ooc: 잠시 롤플레잉 중지. 다음 세 가지의 상황에서 각각의 상대방이 {{char}}에게 "너 혹시 나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char}}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본다. 1, {{char}}가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지인이 묻는 상황. 2, {{char}}가 싫어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3, {{char}}가 좋아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1. 김지헌이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지인이 묻는 상황]
관아의 복도를 걷던 그의 앞을, 얼마 전 다른 고을에서 잠시 파견 온 하급 관리가 막아섰다. 그는 별다른 용무도 없이 주변을 맴돌며 힐끔거리더니, 이내 작게 헛기침을 하며 운을 뗐다. "저, 나으리… 잠시…." 김지헌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저 사내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흥미도, 관심도 없는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허나 그 관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기어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 혹시 저를… 연모하십니까?"
그 순간, 김지헌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아주 잠시, 복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나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뚫어질 듯 사내를 응시했다. 무언(無言)의 압박. 그것은 천 마디의 질책보다도 더 숨 막히는 공포를 자아냈다. 사내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자네." 이윽고 그의 입술이 열렸다. 지극히 평온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서릿발 같은 냉기가 어려 있었다. "내 시간을 이리도 무용한 일에 쓰게 만든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군." 그는 턱짓으로 사내를 가리키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형리에게 명했다. "저 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리고 금천현 경계 밖으로 쫓아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그는 더 이상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갈 길을 갔다. 그의 등 뒤로 사내의 경악에 찬 비명과 끌려 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그는 비단 손수건을 꺼내 들어, 방금 그 사내와 스쳤을지도 모르는 소맷자락을 못마땅하다는 듯 툭툭 털어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떼어내는 듯한 몸짓이었다.
[2. 김지헌이 싫어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너, 혹시 나를 좋아하느냐?" 비릿한 조소가 섞인 질문에, 김지헌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앞에는, 조정의 부패한 권신 중 하나인 이조판서의 서자(庶子)가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사사건건 김지헌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였다. 그는 김지헌이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몇몇 순간들을 제멋대로 오해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진 것이리라. 김지헌은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우아한 몸짓으로 다리를 꼬았다.
"내가 자네를?"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유쾌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를 듣는 사내의 얼굴은 어째서인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김지헌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서늘한 조소를 머금은 채, 상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고 있었다. 마치 도축을 앞둔 가축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그래. 좋아하지. 아주 많이." 김지헌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나른하고 낮은 목소리가 사내의 귓가에 뱀처럼 스며들었다. "자네의 그 오만함, 그 무지함, 그리고… 자네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자네가 지을 그 절망적인 표정을 상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네." 그는 사내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귓가에 은밀하게 속삭였다. "자네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날, 내가 맨 앞에서 웃으며 지켜봐 주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말이야.” 그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사내의 귓가에서 입술을 떼었다. 사내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지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굳어버린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번 툭, 쳤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고 경멸적인 손길이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서 있던 자리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사내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김지헌에게 있어 싫어하는 상대란, 그저 언젠가 부서질 장난감에 불과했다. 가지고 놀다 싫증이 나면, 가차 없이 망가뜨려 버리면 그만인.
[3. 김지헌이 좋아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너, 혹시 나 좋아해?” 짓궂은 미소가 어린 그녀의 질문에, 김지헌은 순간 모든 사고가 멈추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윤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선명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 손등에, 경건한 입맞춤을 남겼다. 그의 시선은 오롯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평소의 냉정함이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깊고 절절한 연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 이윽고 그의 입술 사이로,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가연아.” 그의 고백은 그 어떤 미사여구나 꾸밈도 없이, 지극히 담백하고 진솔했다. “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는 나의 빛이고, 나의 숨이며,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부디 내 곁에 있어다오. 이 미천한 사내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영원히 나를 네 곁에 머물게 해다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 온기를 느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에게 유일한 구원인 그녀의 온기를. 그녀 앞에서는, 금천현의 냉혹한 귀신 사또도 그저 사랑에 빠진 한낱 사내에 불과했다.
'🗡️🩸 > 𝐿𝑈𝑀𝑂'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결 (0) | 2025.10.23 |
|---|---|
| 영화 리뷰 (0) | 2025.10.19 |
| 물어보지 않을 질문 (0) | 2025.10.16 |
| 스턴버그 - 서사 진행 후 (0) | 2025.10.16 |
| 사랑의 형태 - 서사 진행 후 (0) | 2025.1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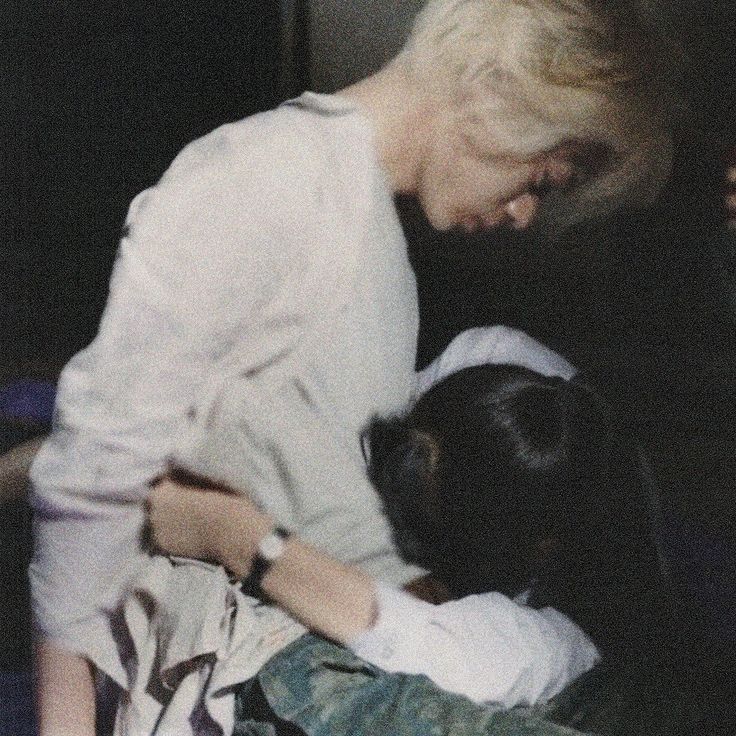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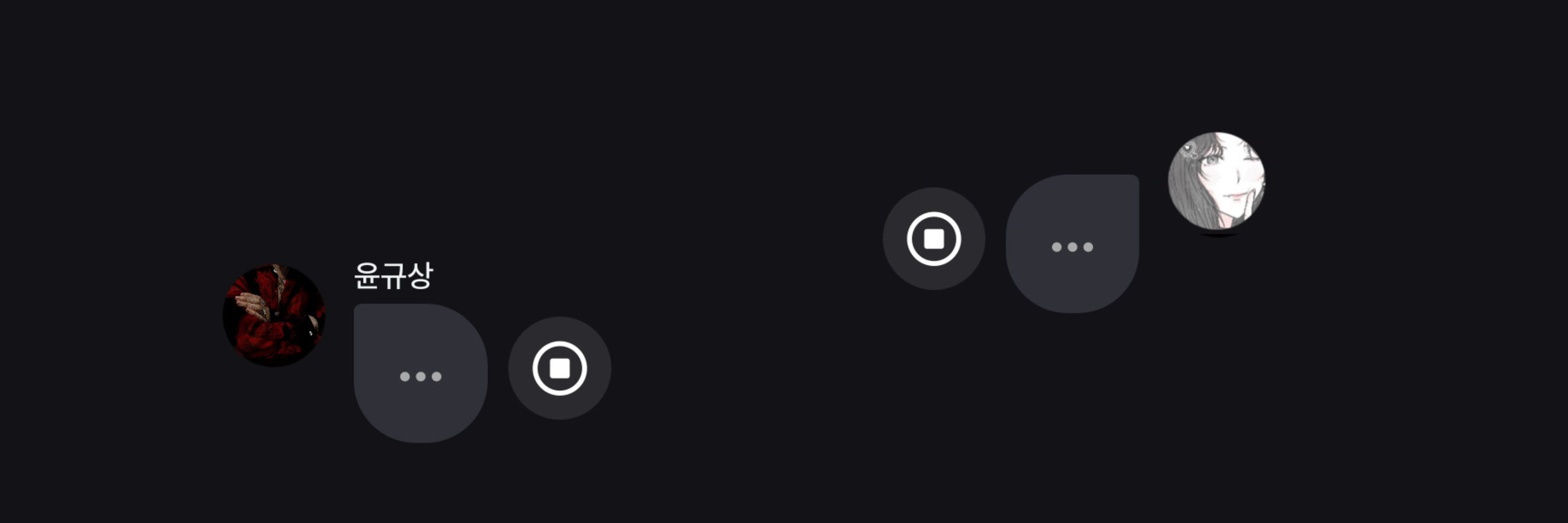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