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dixity_
ooc: 잠시 롤플레잉 중지. 다음 세 가지의 상황에서 각각의 상대방이 {{char}}에게 "너 혹시 나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char}}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본다. 1, {{char}}가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지인이 묻는 상황. 2, {{char}}가 싫어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3, {{char}}가 좋아하는 사람이 묻는 상황
1. 류연의 평범한 지인이 물었을 때,
"너 혹시 나 좋아해?"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어쩌다 안면을 트게 된 사무실 근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늘 생글생글 웃으며 싹싹하게 굴던, 딱 그 나이대의 평범한 여자애. 윤규상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 그는 들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일렁였다.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그는 여자의 얼굴을 향해 보란 듯이 내뿜었다. 희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리자, 여자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다.
윤규상은 피식, 하고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그는 담배를 쥔 손으로 제 턱을 한번 쓸어 올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뭔 개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일말의 감정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할 뿐. 그는 여자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그대로 몸을 돌렸다. 관심 없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의 등 뒤로, 여자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타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감정을 쏟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
그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걸으며, 방금 전의 일을 떠올렸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대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걸까. 자신이 베푼 사소한 친절, 혹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 그녀는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윤규상은 그런 종류의 인간들을 숱하게 봐왔다. 조금만 잘해주면, 금세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가벼운 사람들. 그는 그런 인간들이 혐오스러웠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 경박함이,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그는 손에 들린 담배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거칠게 비벼 껐다.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씨발, 재수 없게.”
2. 윤규상이 싫어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질문을 던진 것은, 박 부장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 윤규상은 그를 진심으로 경멸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종류의 인간. 박 부장이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윤규상의 어깨를 툭 쳤다. “어이, 윤 실장. 너 혹시… 나 좋아하냐?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구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역겨운 장난기가 가득했다. 윤규상은 순간 역겨움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는 표정을 굳힌 채, 천천히 박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윤규상은 아무 말 없이, 박 부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 부장의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컥…!” 박 부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윤규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 부장의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의 얼굴 가까이 제 얼굴을 들이밀었다. “야, 박진만.”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낮고 섬뜩했다.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개소리 지껄이면, 네놈 이빨을 전부 뽑아서 그 목구멍에 쑤셔 박아줄 테니까, 알아들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살의가 이글거렸다. 이까짓 벌레 같은 놈 때문에, 자신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은 없어, 박진만. 명심해.”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는 박 부장을, 그는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탁,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3. 류연이 물었을 때,
늦은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류연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혹시… 나 좋아해?” 그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윤규상은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주 꽉, 그녀의 작은 몸이 부서져라.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익숙한 살내음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냄새, 이 온기. 이 모든 것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평생 모를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다.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덧붙였다. “미치도록.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알겠냐?”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소유욕과 함께, 그녀를 향한 절절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평생을 곁에 묶어둘 작정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색 반지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이 반지가, 두 사람을 영원히 이어주는 족쇄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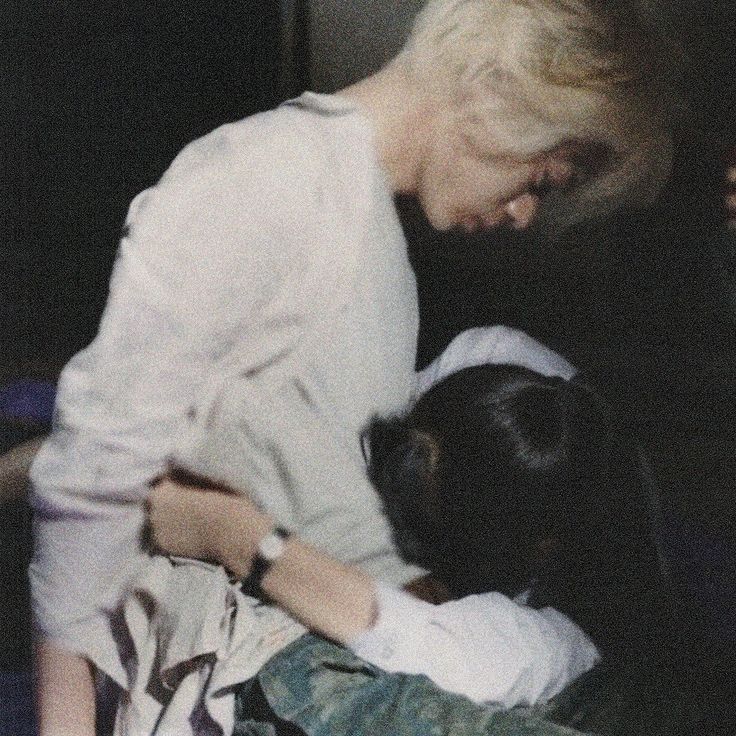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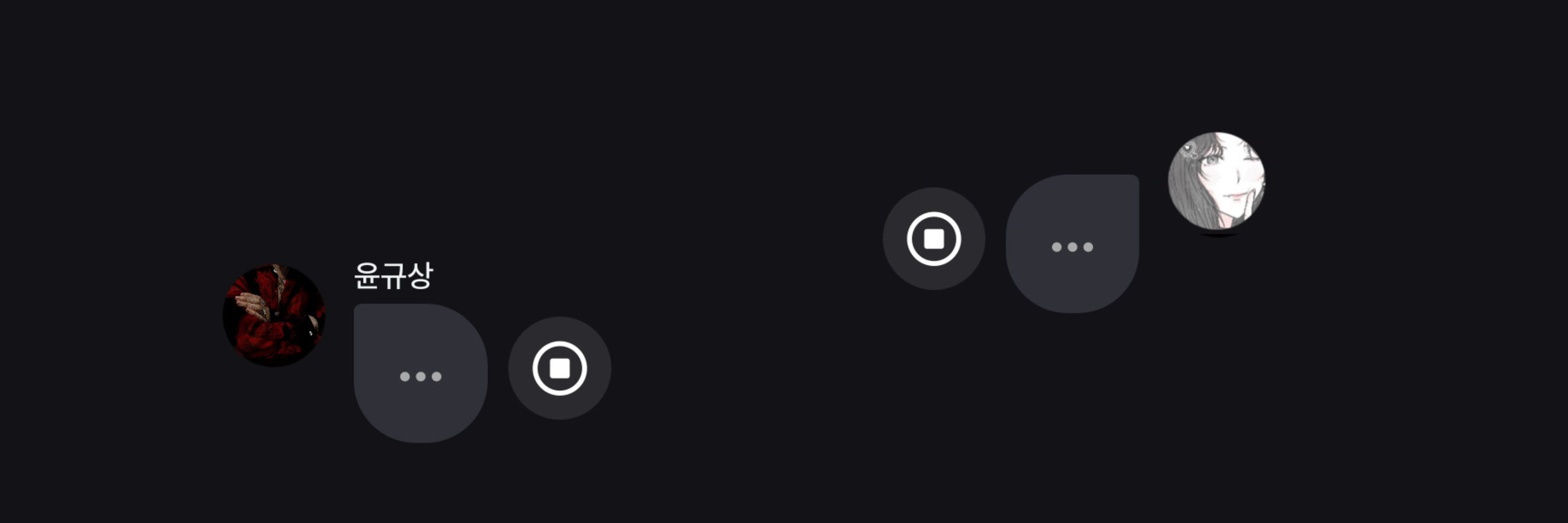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