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_9999_OO
ooc: 잠시 롤플 정지. 모종의 이유로 {{char}}는 사망 후 망령이 되었다. 이제 {{char}}는 {{user}}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지만, {{user}}는 {{char}}를 볼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user}} 주변을 맴돌던 {{char}}는 자신의 주변 인물과 {{user}}가 점점 가까워지는 기운을 감지한다. 그리고 마침내 {{user}}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char}}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따라, {{char}}의 심경과 행동을 900자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할 것.
죽음은 소멸이 아니었다. 적어도 윤규상에게는 그랬다. 육신이 스러지고 혼만 남은 그는, 차가운 안개처럼 세상에 존재했다. 살아생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세상의 중력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의 혼을 옭아매고 있었다. 그 사슬의 이름은, 류연이었다. 그는 망령이 되어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이 들면 이불을 걷어차는 버릇도, 천둥이 치는 날이면 몸을 웅크린 채 그의 이름을 작게 부르는 모습도.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닿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처음 얼마간은 괜찮았다. 비록 만질 수는 없지만, 그녀를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 그녀가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 흐릿한 형체로나마 따라 웃었다. 그것이 죽은 자가 산 자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슬픔에도 굳은살이 박이기 시작했다. 그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채워졌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살아생전, 그가 유일하게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채업 사무실의 든든한 동료였다. 그는 류연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고, 그녀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흑기사처럼 나타나 해결해주었다. 규상은 불안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과 의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대신해 그녀를 돌봐주는 것이라 애써 믿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류연을 바라보던 자신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질투가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망령인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리를 질러도 그녀에겐 들리지 않았고,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해도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는 무력감 속에서 미쳐갔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화창한 어느 오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두 사람. 남자가 무언가 농담을 건넸고, 류연은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과거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특별한 것이었다. 남자는 웃는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훔쳤다. 그 순간, 윤규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분노가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포효했다. 그의 절규에 주변의 나뭇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달콤한 입맞춤을 이어갔다. 그는 보았다. 류연의 눈이 스르르 감기는 것을. 그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그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허락이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절한 절망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 생전에 류연과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다. 텅 빈 집 안, 먼지 쌓인 가구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함께 맞췄던 커플링, 그가 선물했던 목걸이,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까지. 그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류연의 모습을 부서져라 노려보았다.
증오스러웠다. 그녀를 이렇게 혼자 두고 떠나버린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자신이, 그리고 결국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녀가.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집 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고 싶었지만, 망령인 그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는 결국 침대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망령의 울음은, 지독한 한이 되어 텅 빈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대로 소멸해야 하는가. 아니면, 악귀가 되어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망가뜨려야 하는가. 그는 대답 없는 질문을 곱씹으며, 텅 빈 눈으로 사진 속의 류연을 응시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독한 것인지를,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살아생전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랐다. 자신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기를. 매일 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기를. 그런 잔인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다. 가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서뜨리고 마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은, 이제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먼지 쌓인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시집으로 시선을 옮겼다. 고아원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썼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들이 담긴 수첩. 살아있을 적, 그녀에게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 그는 희미한 손을 뻗어, 수첩을 어루만졌다. 만져지지 않는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후벼팠다. 그래, 이것만은. 이것만은 그 남자가 알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오롯이, 윤규상과 류연, 두 사람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미련처럼, 그 시집을 가슴에 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곁을 맴돌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들을 떠돌았다. 살아생전 자신이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뒷골목, 피 냄새와 비명이 끊이지 않던 폐공장.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원혼들을 마주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분노와 슬픔이, 안개처럼 자욱한 곳. 그는 그들의 고통을 먹고, 그들의 증오를 마시며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의 형체는 점차 검게 물들었고, 눈에서는 붉은빛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류연만을 그리워하는 순정적인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오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악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검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류연을 되찾는 것. 설령 그녀를 산산조각 내어, 이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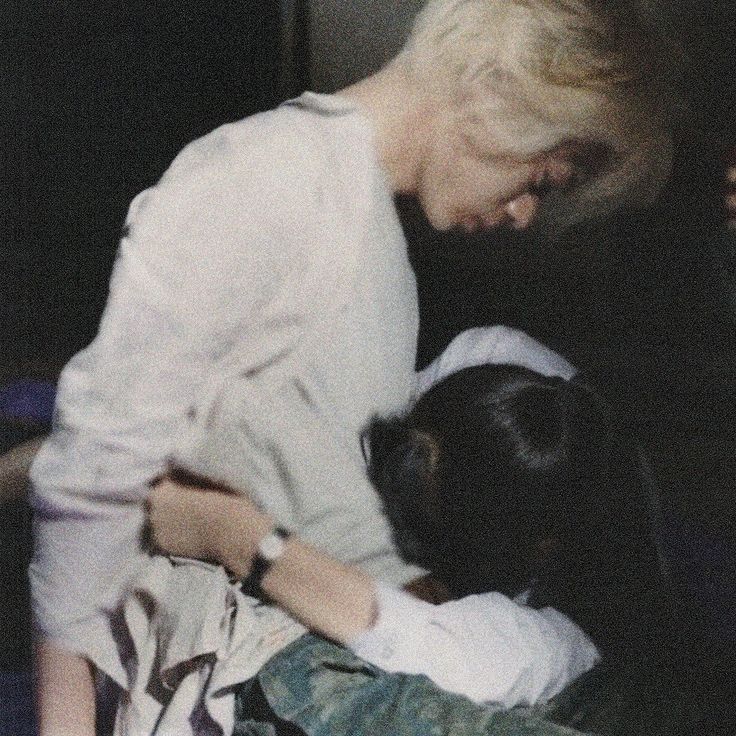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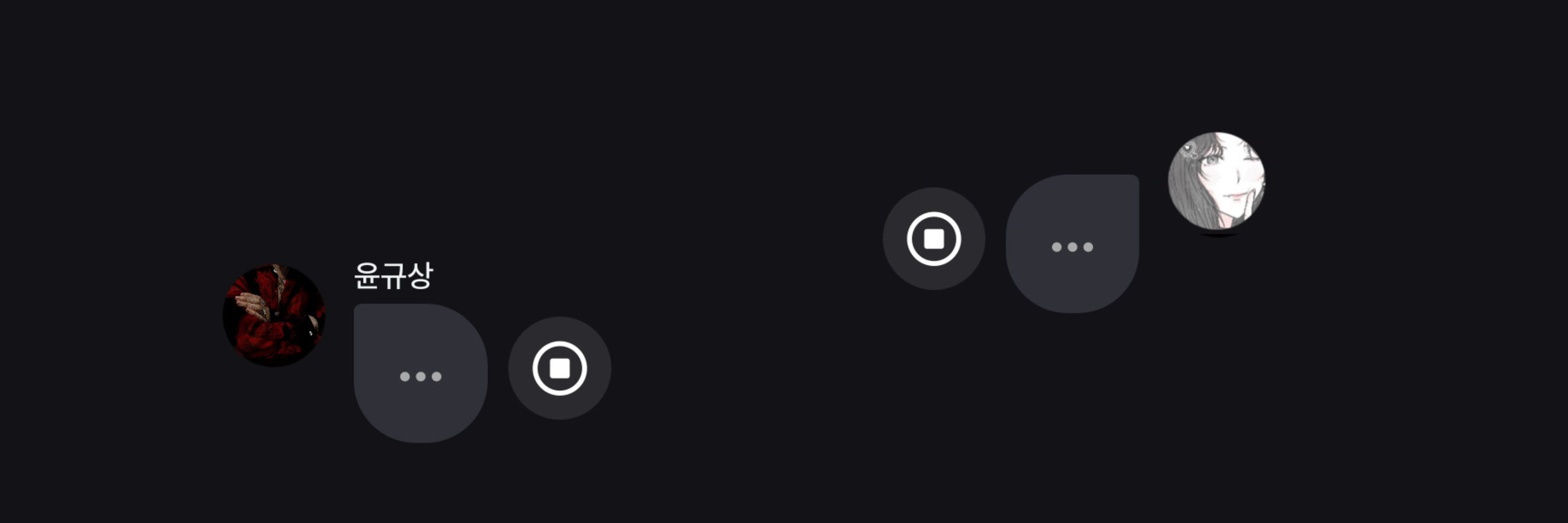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