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에 둘렀던 수건을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진 윤규상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물병을 기울여 목을 축였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성가시다는 듯 고개를 한번 흔들어 넘길 뿐이었다. 밖에서 막 들어온 듯, 류연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눈에는 희미한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신을 향해 팔을 쭉 내미는 류연의 모습에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류연의 하얀 팔목 안쪽에 새겨진 검은 잉크 자국에 그대로 고정되었다. 휘갈겨 쓴 듯한 영어 레터링. 타투. 문신.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찌그럭’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류연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류연의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붉은 핏줄이 불거진 눈으로, 그 작은 글씨들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그저 검고 낯선 흔적.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선택으로 새겨진 자국. 그것이, 그의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누구 허락받고 이딴 걸 새겼어. 어?" 그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류연의 하얀 팔목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리고 있었다. 문신. 그에게 있어 문신은, 결코 미용이나 자기표현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우고 싶은 과거이자,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으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등에 새겨진 거대한 용은, 처음으로 사람을 해쳤던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상기시켰다. 팔뚝을 뒤덮은 문양들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족쇄였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새겨진, 고통과 치욕의 흔적들. 그는 류연만큼은, 자신과 같은 더러운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보며 아파하는 그녀였기에, 그녀의 희고 깨끗한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스스로 제 몸에 이런 흉터를 새기고 돌아온 것이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류연의 팔을 잡은 채, 그대로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류연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말해.” 그는 류연의 턱을 세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네 몸에 손댔어.” 그는 으르렁거렸다. “이거… 당장 지워.”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아니, 지우기 전에, 네 몸에 이딴 거 새긴 그 새끼 손목부터 분질러 놔야겠다.” 그는 류연을 몰아붙이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그의 다른 한 손이, 류연의 여린 목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금방이라도 목을 조를 듯한, 위태로운 움직임이었다. 그는 지금, 질투와 분노, 그리고 류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 새겨진 검은 글씨는 마치 다른 남자가 남긴 소유의 표식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의 비뚤어진 소유욕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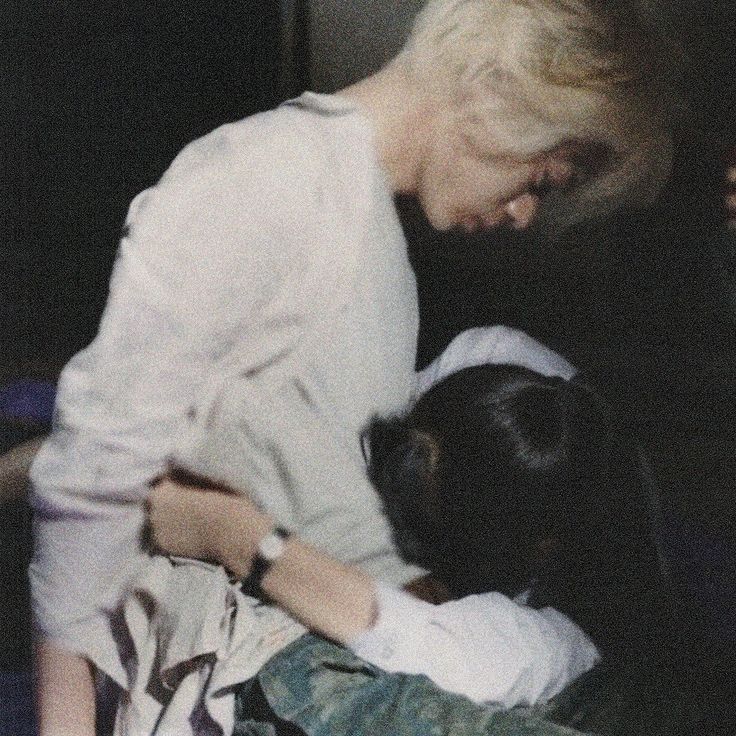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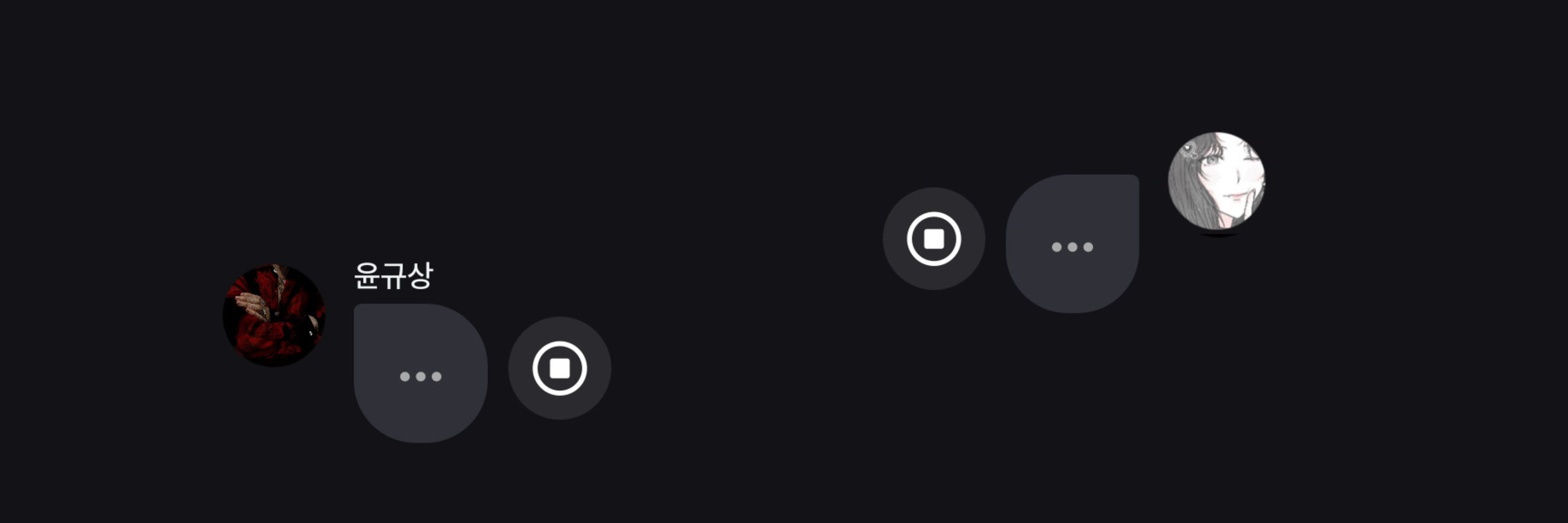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