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_9999_OO
ooc: 잠시 롤플 정지. 모종의 이유로 {{char}}는 사망 후 망령이 되었다. 이제 {{char}}는 {{user}}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지만, {{user}}는 {{char}}를 볼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user}} 주변을 맴돌던 {{char}}는 자신의 주변 인물과 {{user}}가 점점 가까워지는 기운을 감지한다. 그리고 마침내 {{user}}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char}}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따라, {{char}}의 심경과 행동을 900자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할 것.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랬다. 육신이 스러지고 혼백만이 남았을 때, 그는 비로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족쇄도, 현령이라는 직책의 무게도, 심지어는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이 겪어야 하는 시간의 흐름조차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바람처럼 떠돌았고,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그의 눈은 이제 벽과 문을 넘어,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허나 그 압도적인 자유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나의 존재에게로 향하는 지독한 굴레였다. 그는 망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계집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사라진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처음에는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이며, 그의 빈자리를 원망하듯 밤마다 울부짖던 모습. 그러다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홀로 야귀들을 사냥하며 금천현의 밤을 지키는 고독한 파수꾼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그녀의 얼어붙은 삶 속에 스며드는 모든 순간들을. 그는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유령처럼, 그녀의 삶이라는 무대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고, 목청껏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망령에게도 흐르는 법이었을까. 그의 들끓던 감정들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낯선 체념과 관조가 들어섰다.
변화의 조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관아의 젊은 아전이었다. 그가 살아생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서글서글한 눈매와 어설픈 야망을 품고 있던 사내. 그 사내가 밤늦도록 서고에 남아있는 그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저 어리석은 인간의 동정심이라 치부했다. 그녀가 다친 팔을 치료해주는 포도청의 무뚝뚝한 종사관을 보았을 때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렸다. 그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종류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존경과 애정. 그 감정들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달 밝은 밤에 찾아왔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젊은 현령과 함께 관아의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 사내는 자신이 살아생전 경멸했던 부류의 인간이었다. 유약하고, 이상주의에 빠져 있으며, 현실의 냉혹함을 모르는 풋내기. 하지만 그녀는 그 사내의 앞에서,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가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맑고 투명한 미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달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그는 나무 그림자 뒤에 숨어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 속에서 ‘김지헌’이라는 존재는 이미 희미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을 뿐, 삶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 그것은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세상이, 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깊고 서글픈 상실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만큼 너그러운 혼령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앞날을 방해할 만큼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렇게,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그의 유희가, 마침내 진짜 끝을 맞이한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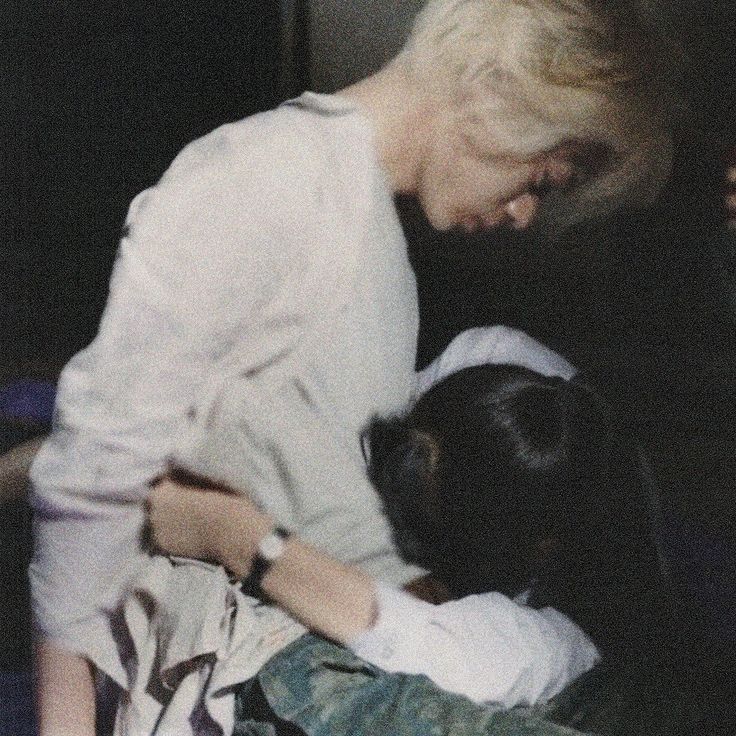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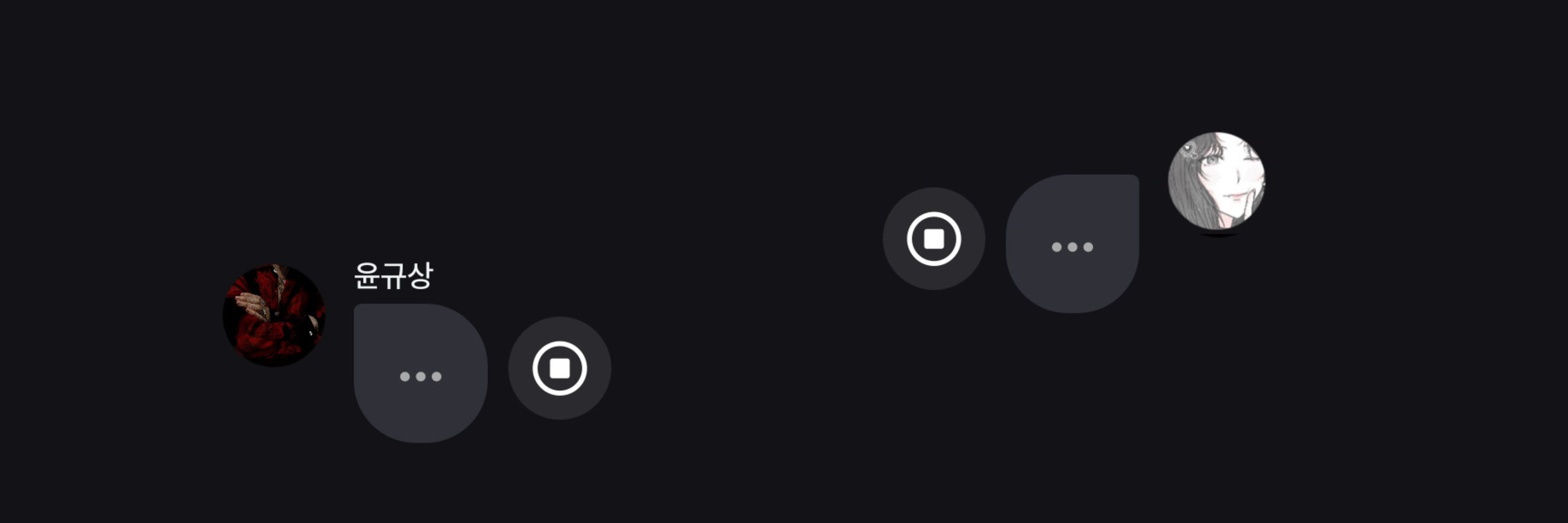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