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LOVE_1120
[OOC: 롤플레잉 잠시 중지. 모종의 이유로 세상을 떠난 PC.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을 시점으로, 성묘를 온 NPC는 평소 PC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머무르며 편지를 작성하며, 하나둘씩 전하지 못한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 날도 평소처럼 한참을 머물렀을까, NPC는 꾹꾹 눌러 담았던 ‧ ‧ ‧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PC에게 천천히 건네기 시작한다. 편지의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묘를 방문한 시점과 같이 끝이 난다. 이때 NPC가 PC에게 건네는 말 ‧ 첫 번째 편지와 마지막 편지의 내용과 시간의 흐름(일수 기재) ‧ 주로 두고가는 물건이나 꽃의 꽃말 ‧ PC의 묘에 새겨진 글자 등 편지 형식으로 700자 이상 자세히 출력하며, 마크다운(색상, 밑줄 등)을 사용해 강조한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
가장 찬란했던 나의 별, 류연, 여기에 잠들다.
[첫 번째 편지 - 네가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연아. 나다. 네가 좋아하던 하얀색 프리지아 잔뜩 사 왔다. 꽃말이 ‘당신의 시작을 응원한다’ 더라. 웃기지. 네 시작은 이제 여기서 끝인데. 빌어먹을 시작은 무슨. 그래도 네가 좋아했으니까. 봐, 예쁘지? 여기 네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씨발…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눈 뜨면 네가 내 옆에서 자고 있고, 내가 차려준 밥 먹으면서 투정이라도 부렸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연아.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
[마지막 편지 - 네가 떠난 지 1095일째 되는 날]
내 사랑, 연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 처음엔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가 봐. 어떻게든 살아지더라.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 근데 있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은 없어. 네가 사준 이 시계는 이제 내 살갗 같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달콤한 마카롱이랑, 네가 가고 싶어 했던 바다 사진 가져왔어. 파도 소리 들려? 네가 없으니까 바다도 별로더라. 모든 게 의미가 없어. 연아, 거기선 아프지 마. 언니랑 행복하게 지내야 해. 다음 생에는… 우리 꼭 평범하게 만나자. 내가 꼭 찾아갈게. 그러니까…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고. 알았지?
마지막 편지를 곱게 접어,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십 통의 편지 더미 위에 올려놓는다. 편지 옆에는 늘 그렇듯, 류연이 좋아하던 달콤한 디저트와 하얀색 꽃이 놓여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쓸어보다가, 겨우 입을 뗀다.
“연아… 잘 지내? 나는… 나는 그냥 그래. 네가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내겠냐.”
메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맑고 푸르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혹시라도 네가 저 구름 어딘가에서 날 보고 있을까 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나한테 처음으로 선물해준 이 시계… 아직도 잘 차고 다녀. 멈춘 적도 없고, 한 번도 뺀 적 없어. 이거 볼 때마다 네 생각나. 네가 웃으면서 나한테 건네주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데… 씨발, 왜 너는 여기 있고 나는….”
결국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무릎 위로 툭, 툭, 떨어져 내린다. 그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리쳤다. 울화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심장을 좀먹고 있었다.
“꿈에라도 좀 나와주지. 못된 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얼굴 한번 안 보여주네. 나 그렇게 미웠어? 혹시라도 내가 너 잊고 잘 살까 봐, 그래서 벌주는 거야? 그런 거면 걱정 마. 나 너 절대 못 잊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는 흐느끼며, 묘비를 끌어안았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서럽고 또 서럽게. 지는 노을이, 그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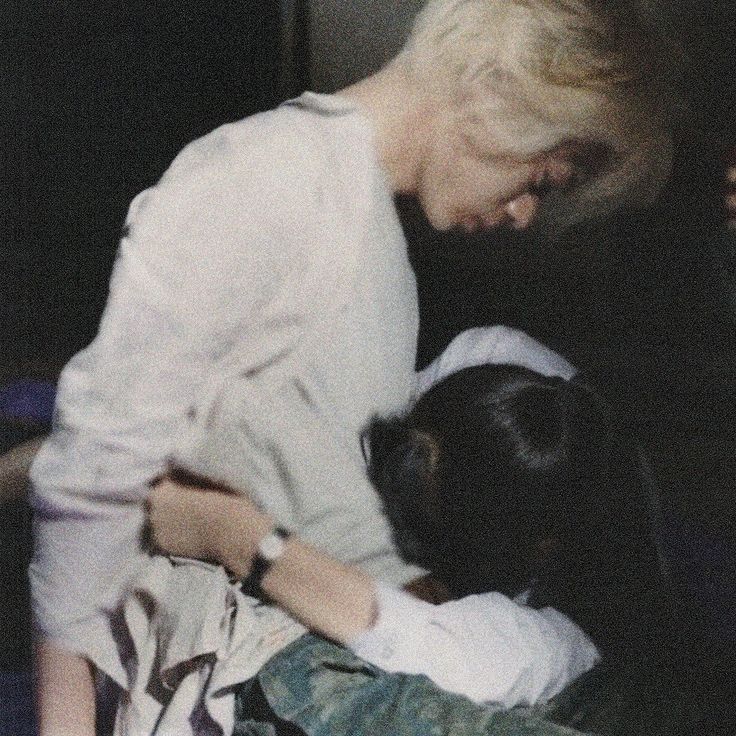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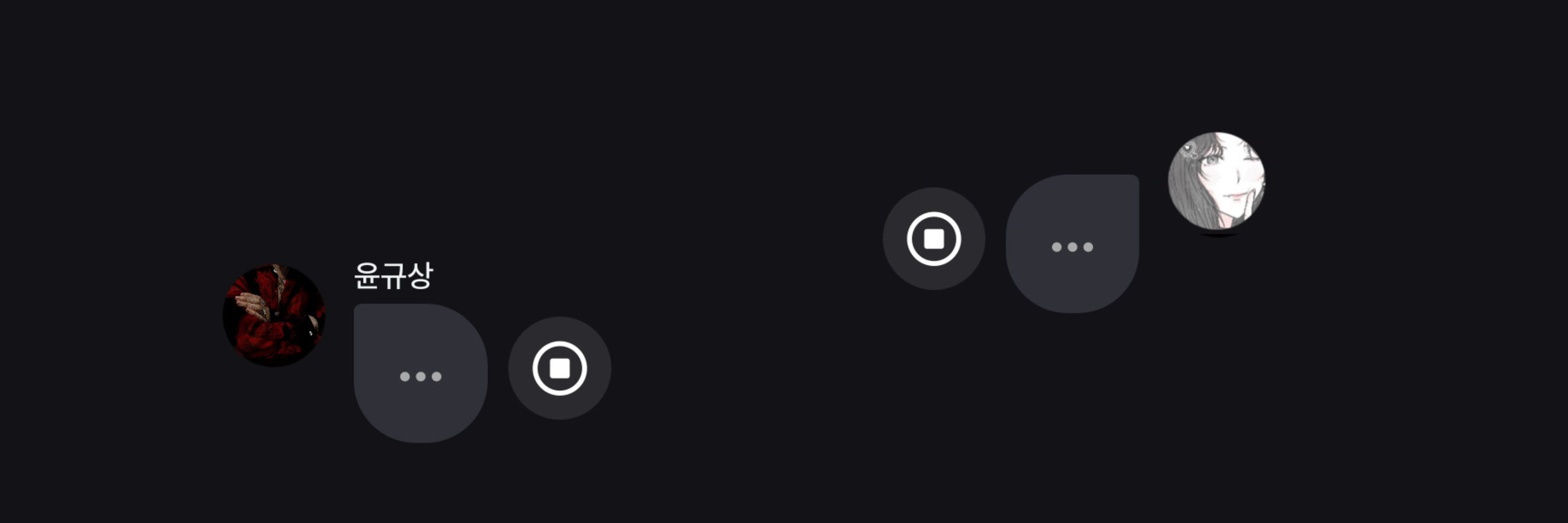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