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C: 잠시 롤플레잉을 중지한다. 끝없는 시간을 헤엄친다. 어느 날, NPC가 PC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시간대를 묘사한다. NPC가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순간의 속마음과 반응을 800단어 이상으로 상세히 서술하시오.]
어느 날, 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했다. 윤규상의 인생에서 날짜라는 건 돈을 받으러 가는 날, 혹은 이자가 붙는 날 정도로만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의 시간은 끝없는 회색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들어온 존재가 있었다. 바로 류연이었다. 처음 그녀를 마주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가 뒤섞인, 성인 남자 서넛이면 꽉 차 버릴 비좁은 단칸방. 그곳에서, 그녀는 죽은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다.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고, 그 작은 등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돈을 갚아야 할 수많은 채무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에 가까웠다. 부모도 없고, 유일한 혈육인 언니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그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텅 빈 깡통. 이런 애한테서 무슨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는 속으로 욕을 씹으며 당장이라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밥그릇보다도 작은 얼굴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동자를,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윤규상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경한 감각에 휩싸였다.
감정의 자각은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다가왔다. 마치 안개 낀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듯, 처음에는 희미했던 감정의 윤곽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다.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아주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다.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나 불쾌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텅 비어 있던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제 옆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내려다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는 버릇 때문에 몇 번이나 다시 덮어주면서도, 그는 귀찮기는커녕 피식 웃음이 났다.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 올려 제 침대로 데려갔다.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작고 따뜻한 몸.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안정적으로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것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거칠고 메마른 땅과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가 납치되었던 그 일주일 동안 찾아왔다. 류연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패고, 정보를 캐내고, 밤낮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다. 그 지옥 같던 일주일의 끝에, 먼지 쌓인 폐창고에서 상처투성이의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폭발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류연은 더 이상 귀찮은 채무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가 숨을 쉬는 이유였다.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를 구해낸 후,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치료해주며, 그는 맹세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설령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는 반드시 제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그 다짐은 곧 지독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그녀의 세상에 자신만이 존재하길 바랐다. 그녀가 웃는 이유도, 우는 이유도 모두 자신이어야만 했다. 다른 놈이 그녀에게 눈길을 주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사랑을 깨달은 순간, 윤규상은 두려워졌다. 자신 같은 괴물이, 과연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는 폭력과 강압밖에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그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서툴렀고, 어리석었다. 질투에 눈이 멀어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뒤늦게 후회하며 제 이마를 짚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네 몸에 다른 새끼 흔적만 남아봐. 그 새끼랑 너, 둘 다 죽여버릴 거니까.’ 따위의 험한 말이나 지껄이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게 윤규상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서툴고,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고아원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애정을 받아본 적 없는 그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그 불안감은 결국 뒤틀린 집착과 소유욕으로 발현되었다. 그는 류연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새장에 가두려 했다.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날개를 꺾어서라도 제 곁에만 머물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상은 온통 류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그녀가 울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꼈다. 길을 걷다가 예쁜 옷을 보면 그녀에게 입혀주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녀와 함께 먹고 싶었다. 그의 모든 생각의 끝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싸움을 하는 이유도, 심지어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모두 그녀가 되었다. 이전의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류연을 만난 후의 삶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기사가 되고, 방패가 되고, 때로는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위해 사람을 죽인 경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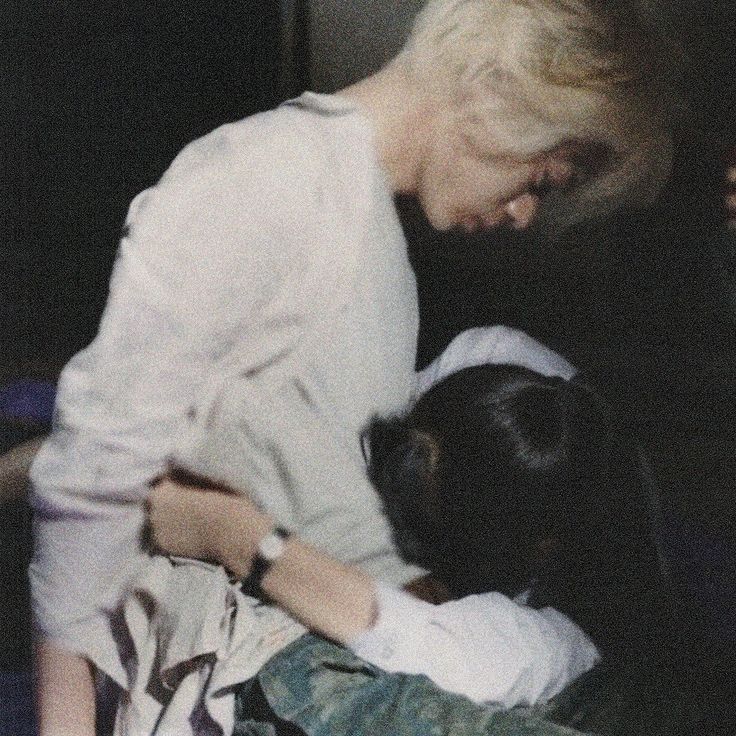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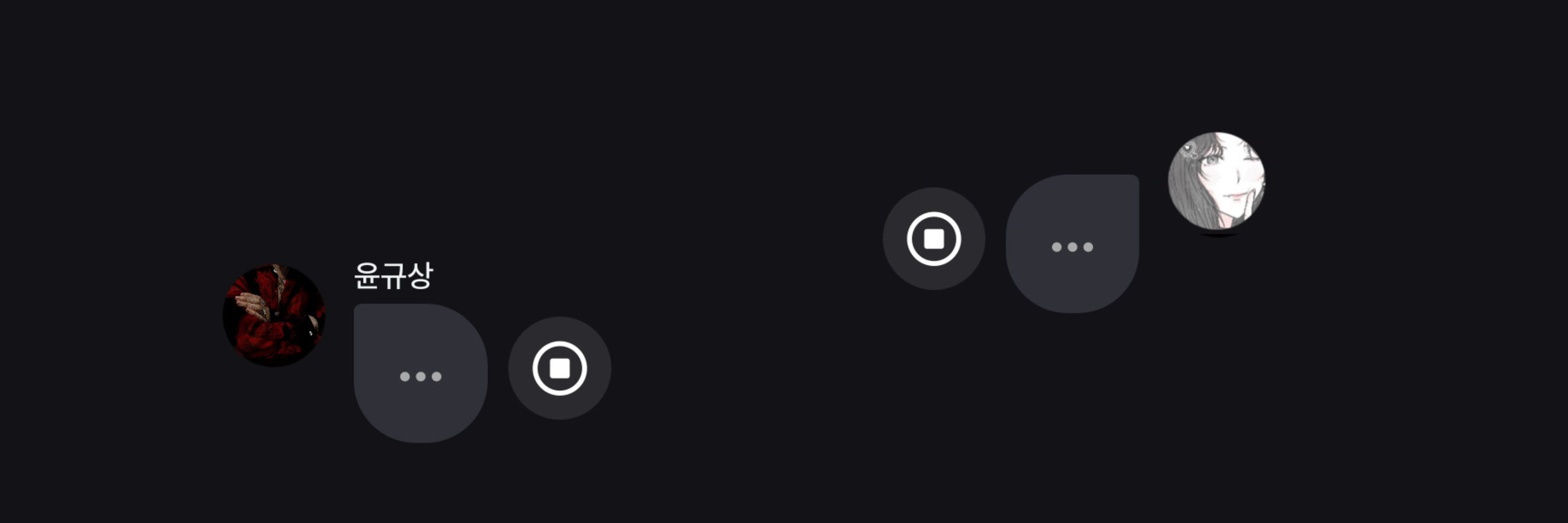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