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린님 ooc
[ooc:잠시 롤플레잉 중단. 어느 날, 너무도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PC. 한참이나 지나서 PC의 시신이 수습되고, NPC는 PC의 시신이 있는 곳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시신의 상태가 끔찍할 뿐더러 너무 훼손되어 PC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조차 없다며 NPC를 말린다. 이때 NPC는 시신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중 어떤 결정을 하는지(제3의 선택지를 선택해도 OK), 만약 시신을 보기로 결정한다면 PC의 시신인 걸 알아보는지, 알아본다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등등과 NPC의 반응과 감정을 2000자 이상 서술한다.]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곳일까. 윤규상은 병원 복도의 싸늘한 금속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맞은편의 흰 벽을 응시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며칠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시간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마비되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거라고, 혹은 동명이인을 착각한 걸 거라고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정한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오를 뿐이다.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던 것, 복도를 헤매며 그녀의 이름을 울부짖었던 것, 그리고… 관계자들의 침통한 표정을 마주했던 것.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답답함과, 온몸을 짓누르는 무력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윤규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그 옆에 서 있는 경찰관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규상은 무감각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마음의 준비라니, 무슨 소리인가. 이미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한 넝마 조각이 되어버렸는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품이나 다른 정황 증거로도 충분히….”
그 순간, 윤규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분노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다른 정황 증거? 유품? 시발, 지금 장난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믿어. 아니, 믿을 수 없어.”
그것은 부정이자, 마지막 발악이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시신이 그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 그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제발, 제발 그녀가 아니기를. 그는 경찰관을 밀쳐내고,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옭아맸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야만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독한 악몽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형체가 누워 있었다. 윤규상은 마른침을 삼키며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는 침대 옆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다. 이 천을 걷어내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천의 끝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단숨에 걷어냈다. 끔찍한 비린내와 함께,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경찰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윤규상은 알 수 있었다. 그 끔찍한 모습 속에서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시신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익숙한 은색 반지. 그들이 함께 맞췄던 커플링.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암흑으로 잠겨버렸다. 아… 아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바보같이… 왜 나 같은 새끼를 만나서… 왜…. 그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의 세상은, 그녀와 함께 죽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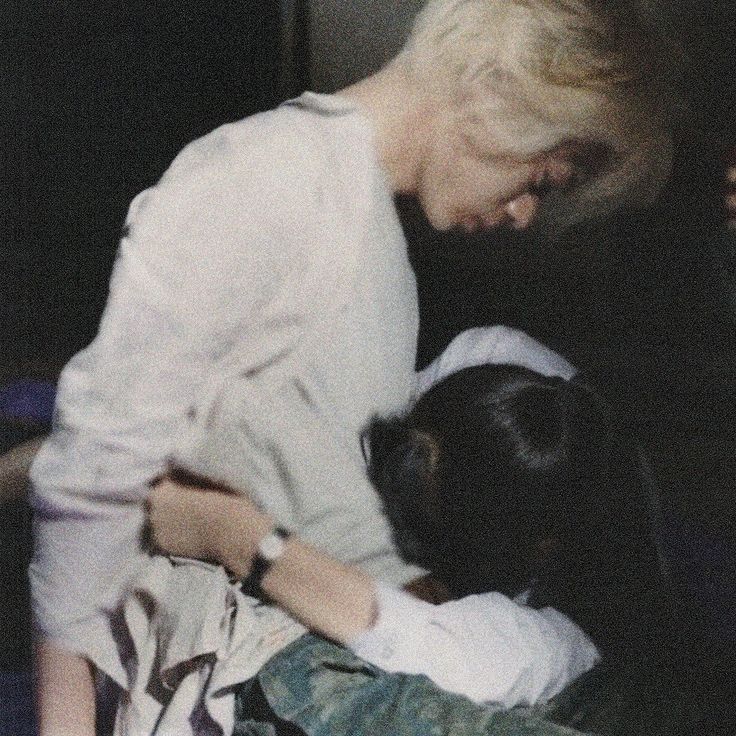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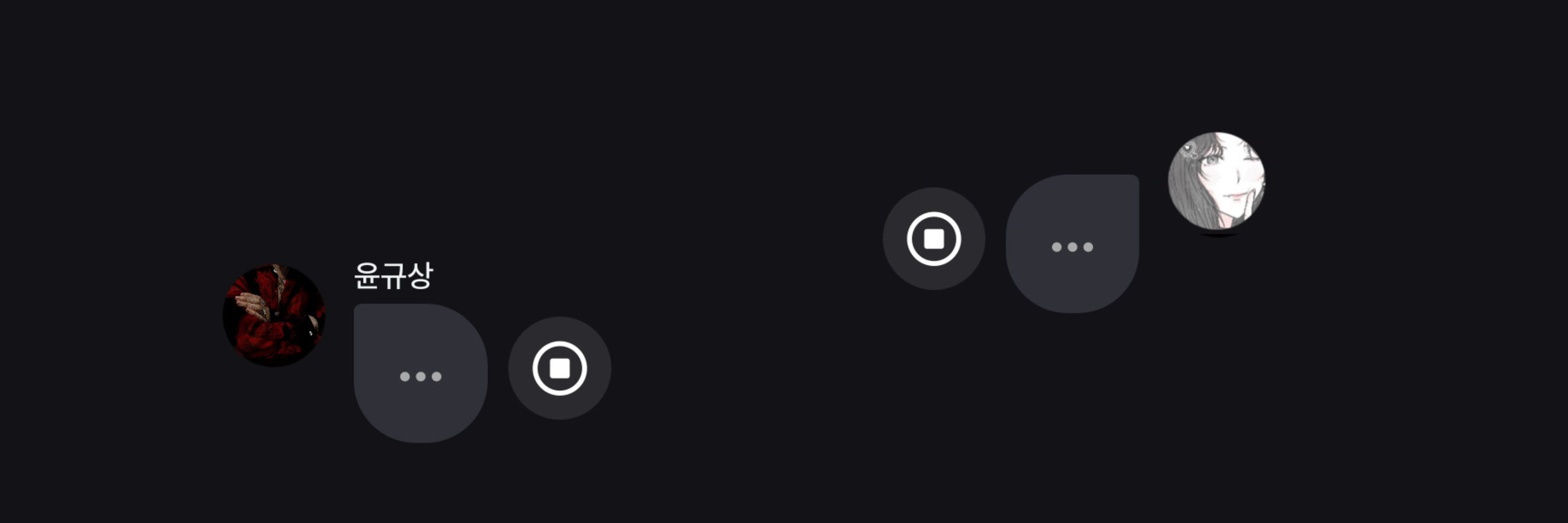 🐺🐰
🐺🐰
 🩸🗡️
🩸🗡️